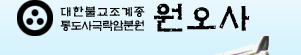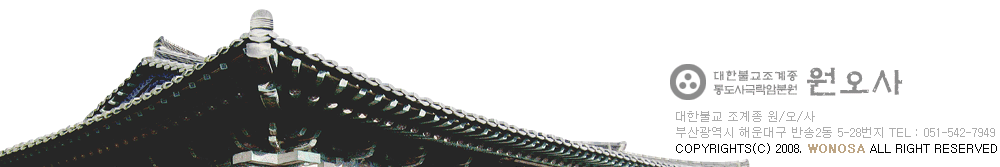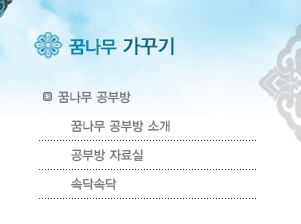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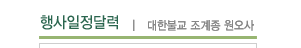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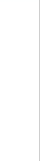 |
 | 2026 / 2 |  | | 日 | 月 | 火 | 水 | 木 | 金 | 土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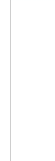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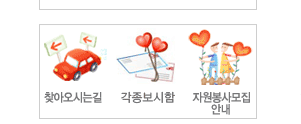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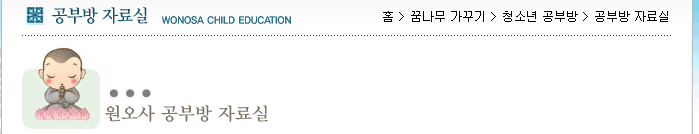 |
|
 작성일 : 09-03-27 19:58
작성일 : 09-03-27 19:58
|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법론] 3.공부는 왜 재미 없을까?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118
|
〈3〉공부는 왜 재미 없을까?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면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사기꾼인가보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고역으로 느낄 뿐 기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임을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얼굴이 시무룩해진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자. 아이들은 딸기, 바나나, 키위, 사과 등이 그려진 그림책을 닳아질 정도로 읽는다. 귀찮을 정도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떼를 쓴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는 데에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된다.
공부는 왜 재미가 없을까?
군대에서는 하루 종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책상을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처벌이 있다. 책상을 옮기는 일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용한 일에 자신이 쓰이고 있으므로 자신의 존재가치에 회의가 든다. 쓸모없는 단순 작업을 반복하며 점차 정신적 모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짐을 들어 드리면 가슴이 뿌듯하다. 짐을 들어 주면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여 준다. 따라서 봉사를 하다보면 힘이 들어도 또 하고 싶어진다.
공부가 고역이 되어선 안 돼
뿌듯한 마음 느낄 수 있어야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를 한 후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낀다면, 공부는 힘들어도 하고 싶은 공부, 재미있는 공부가 된다. 그러나 알아도 별 도움이 안되는 지식을 이유 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면 군대에서 처벌 받는 군인처럼 자신의 존재가치에 회의가 들고 공부는 고역이 될 수밖에 없다.
군대에서 책상 옮기기 처벌과 할머니의 짐을 옮겨 드리는 일은 같은 종류의 노동인데 노동을 하고 난 이후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우리 공부방법은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 후 정신적 모멸감과 무력감을 느낄까 아니면 뿌듯함을 느낄까? 공부하는 아이들을 야단치기에 앞서 어른들 스스로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군대식 처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잃어가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 것이 아닐까? 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식 공부는 아이들의 정신을 마모시킬 뿐이다. 학원은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숙제를 내주어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를 끊임없이 풀면서 자신을 소진시키게 한다. 이런 공부 방법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해친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충만한 마음보다는 다 타서 하얗게 변한 연탄재와 같은 마음만 남는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식어버린 연탄재, 열기도 의욕도 없는 연탄재이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공부는 고역이 되어 간다. 공자는 사기꾼이 되어 버렸다. 아이들이 할머니 짐을 들어 준 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이 뿌듯한 공부를 한 후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공자도 복권이 될 것이다.
황남기 / JLS 주니어 로스쿨 아카데미 대표
[불교신문 2496호/ 1월28일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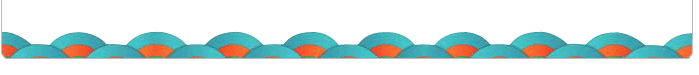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