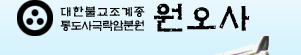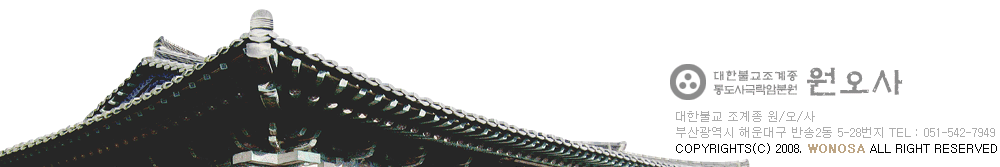훌륭한 불자인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생과 구류의 중생들 모두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목적 삼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요긴한 답이 됩니다.
달리 말해서 ‘나’, ‘나’ 하는데 ‘나’는 생각할 바 아니고
일체 중생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행복의 길로 들게 하겠다는 서원과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나’는 이미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가 없음으로써
일체 중생을 위한 삶을 목적 삼으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고 양육하는 데 자신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불고(不顧)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마음을 어찌 쓰며 살아 갈 것인가?’라는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
쓸 마음도 없이 쓰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는
마음의 쓰임이 나타납니다. 그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면
불현듯 무시겁을 두고 ‘나’라고 생각해 왔던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등이 본디 없음이 홀연히 드러납니다.
결국 육바라밀로 알려진 대승 불자의 덕목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 깨달음은 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행동하라
부처님의 피안에 이르는 길은 앞서 논한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나’나 ‘내 것’이라는 관념이 틈을 타기 이전에 일체 중생을
무여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보살의 행,
즉 육도만행(六度滿行: 육바라밀을 완전하고 원만하게 수행하는
일)이 그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아상과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상대 즉 인상,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우매한 마음인 중생상과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수자상 역시 모든 것의 출발은 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 사상산을 타파한다 함은 상의 산을 만들어 놓고서
타파함이 아니라, 타파해야 할 상의 산이 본디 없음을 적실하게 지적하여 몰록 자성을 보아 지혜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기에
이 같은 내용이 금강경의 대의가 되는 것입니다.
타파해야 할 상의 산도 없거니와 역설적으로 말하면
올라야 할 반야의 봉우리도 없음이요,
깨쳐야 할 무명의 업장도 없음이며,
이뤄야 할 부처 자리도 없음이고,
벗어나야 할 중생심도 없음입니다.
그리하여 필경에는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본무차별인 평등성지 대원경지의 바다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대의가 완성되는 부분은 바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수봉행(信受奉行)’이라는 네 글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신수봉행, 이 네 글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믿음(信)이 하나요,
받아 지녀 이해함(受)이 둘이며, 받들어 공경함(奉)이 그 셋이요,
낱낱이 실천하여 쉬지 않는 것(行)이 넷이니, 이렇게 행하는 이가 이르러 갈 곳은 필경
무상정등정각의 자리 외에는 다른 곳이 없을 것입니다.
|